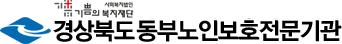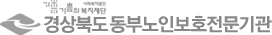울고싶은 남자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464회 댓글 0건본문
동아일보 2005.8.31
《“예전에 탑골공원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보면 ‘왜들 저러고 계신가. 친구들이라도 만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머지않아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3년 전 은퇴한 김모(57·서울 종로구 창신동) 씨는 함께 소일할 친구가 없는 게 요즘처럼 아쉬울 때가 또 있었나 싶다. 막상 퇴직하니 마땅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 처음엔 북한산으로, 대중사우나로, 골프연습장으로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한다며 혼자 돌아다녔지만 수입도 없는 처지에 그 생활도 오래할 건 못 됐다.》
“친구들 대부분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 친구 챙기기가 쉽습니까? 직장, 가족, 경조사, 고향 부모, 친척 챙기느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해를 넘기기 일쑤였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친구들과도 시나브로 연락이 끊기더라는 것. 요즘은 옛 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북한산에 다니지만, 그렇다고 더 자주 만날 사이는 아니다. 현직에 있거나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주말에 가끔 모여 골프를 치는 것 같은데 끼어들기 어렵다. 우동 국물에 말아 먹을 맨밥을 싸가지고 구립 도서관에 가서 소설책을 읽는 게 요즘 그나마 낙이다.
한국 남자들의 은퇴 후 생활은 그다지 장밋빛이 아니다. 직장 떨어지고 돈 떨어진 뒤 주변을 돌아보니 어느새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이다.
S그룹에서 명예퇴직한 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53) 씨 역시 요즘 주말이면 쓸쓸하기 그지없다. 기업 간부 시절 즐겼던 골프는 이제 같이 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경제적 여유도 안 된다. 아내 따라 교회에 가봤지만 적응이 안 돼 대학생인 딸을 따라 스포츠센터에 가곤 했다. 딸이 반기지 않는 눈치인 줄 알면서도 아빠의 권위로 밀어붙여 따라다녔지만 운동이 끝나면 항상 혼자 돌아와야 했다. 샤워 후 함께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지만 딸은 샤워실에 들어가면서 친구들 만나러 갈 거라며 “아빠 먼저 가”라고 말한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그러다 얼마 전부터 취미 붙인 게 같은 상가의 비슷한 연배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거다. 예전엔 토, 일요일에 문을 여는 카페를 보면 ‘도대체 누가 주말에 술을 마신다고 문을 열까?’ 싶었는데 바로 자신 같은 손님들 때문에 문을 연다는 걸 깨닫게 됐다.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김경호(金京浩) 교수는 “지금 40, 50대 남자들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엔 나름대로 대비를 하지만 친구나 대인관계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다”며 “적금을 들고 노후를 준비하듯이 평상시에도 친구나 주변사람들, 동호회나 동료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친구도 돈도 직장도 다 잃고 늙은 몸만 남았을 때 함께 있고 싶어 할 사람은 없다”며 “대개 일, 가족, 친지 순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데, 힘들더라도 친구들끼리의 모임이나 여행 등 젊었을 때 만나던 패턴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한국 남자들의 저물녘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더더욱 쓸쓸해진다. 취재팀은 지난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온다는 이모(67) 씨는 “공원에 나오는 건 굳이 따지자면 가야할 곳을 만들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할 일은 없지만 그냥 마음이 편해, 다들 같은 처지니까….”
이 씨는 30년 동안 일해 서울 강북에 25평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고, 네 딸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고 한다.
“딸들이 보란 듯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결혼식장에서도 뿌듯하기는 마찬가지였지.”
그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가 이내 한숨을 쉬었다. 출가한 네 딸은 이젠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어렵다. 이제 남은 것은 늙은 몸과 딸들이 가끔 주는 용돈, 명절 때 가끔 보는 손자 손녀들이다. 남들은 ‘딸 집을 돌아다니며 손자들 보면서 놀다 오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다. “눈치가 보여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노인들이 요즘 떠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상처(喪妻)한 뒤 서울의 아들 집에 살게 된 노인이 우연히 아들 부부가 자기들끼리 식구들의 순번을 붙여 “1번 학원 갔니?” 식으로 부르는 걸 엿들었다는 것.
우선순위 1번은 아이(손자)였고, 2번은 며느리, 3번은 아들, 4번은 아이 봐주는 가정부였다. 그런데 노인은 5번도 아니었다. 5번은 애완견이었던 것. 며칠 후 노인은 “3번아 찾지 마라, 6번은 간다”는 쪽지를 남겨 놓고 시골집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설마 실제 이야기겠어. 웃자고 만든 거겠지.”
한 2년 전부터 이곳에 나온다는 강모(66) 씨는 “은퇴하니까 집에만 있던 아내가 오히려 더 신세가 좋아 보이더라”고 말했다.
“10년이 넘게 한동네서 살았으니 아내는 이웃들을 잘 알지. 친구도 유지되고. 자기들끼리 놀러도 가고. 그런데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매일 아침 회사 가서 밤늦게 들어왔는데….”
퇴직 전 중소기업에 다녔다는 한모(69) 씨는 “아내가 친구들하고 놀러가는 걸 막으면 ‘좀팽이’ 남편이 되지만 남자들이야 어디 그럴 수 있나. 당장 난리가 난다. 30년 동안 친구들하고 여행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푸념했다.
전남대 심리학과 윤가현(尹嘉鉉·한국노년학회 부회장) 교수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채 노년을 맞은 노인들에겐 각종 노인 관련 강좌, 노인대학, 건강교실, 레크리에이션 등에 참가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며 “보통 ‘에이 그런데 가서 어떻게 즐기고 사람을 만나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자각을 주는 강의를 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경제적 상태는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심리적인 상태가 변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예전에 탑골공원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보면 ‘왜들 저러고 계신가. 친구들이라도 만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머지않아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요.” 3년 전 은퇴한 김모(57·서울 종로구 창신동) 씨는 함께 소일할 친구가 없는 게 요즘처럼 아쉬울 때가 또 있었나 싶다. 막상 퇴직하니 마땅히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다. 처음엔 북한산으로, 대중사우나로, 골프연습장으로 모처럼의 여유를 만끽한다며 혼자 돌아다녔지만 수입도 없는 처지에 그 생활도 오래할 건 못 됐다.》
“친구들 대부분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동안 친구 챙기기가 쉽습니까? 직장, 가족, 경조사, 고향 부모, 친척 챙기느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해를 넘기기 일쑤였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 친구들과도 시나브로 연락이 끊기더라는 것. 요즘은 옛 직장 동료들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북한산에 다니지만, 그렇다고 더 자주 만날 사이는 아니다. 현직에 있거나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주말에 가끔 모여 골프를 치는 것 같은데 끼어들기 어렵다. 우동 국물에 말아 먹을 맨밥을 싸가지고 구립 도서관에 가서 소설책을 읽는 게 요즘 그나마 낙이다.
한국 남자들의 은퇴 후 생활은 그다지 장밋빛이 아니다. 직장 떨어지고 돈 떨어진 뒤 주변을 돌아보니 어느새 친구들도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이다.
S그룹에서 명예퇴직한 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53) 씨 역시 요즘 주말이면 쓸쓸하기 그지없다. 기업 간부 시절 즐겼던 골프는 이제 같이 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경제적 여유도 안 된다. 아내 따라 교회에 가봤지만 적응이 안 돼 대학생인 딸을 따라 스포츠센터에 가곤 했다. 딸이 반기지 않는 눈치인 줄 알면서도 아빠의 권위로 밀어붙여 따라다녔지만 운동이 끝나면 항상 혼자 돌아와야 했다. 샤워 후 함께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지만 딸은 샤워실에 들어가면서 친구들 만나러 갈 거라며 “아빠 먼저 가”라고 말한다.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그러다 얼마 전부터 취미 붙인 게 같은 상가의 비슷한 연배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거다. 예전엔 토, 일요일에 문을 여는 카페를 보면 ‘도대체 누가 주말에 술을 마신다고 문을 열까?’ 싶었는데 바로 자신 같은 손님들 때문에 문을 연다는 걸 깨닫게 됐다.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김경호(金京浩) 교수는 “지금 40, 50대 남자들이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엔 나름대로 대비를 하지만 친구나 대인관계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다”며 “적금을 들고 노후를 준비하듯이 평상시에도 친구나 주변사람들, 동호회나 동료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친구도 돈도 직장도 다 잃고 늙은 몸만 남았을 때 함께 있고 싶어 할 사람은 없다”며 “대개 일, 가족, 친지 순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데, 힘들더라도 친구들끼리의 모임이나 여행 등 젊었을 때 만나던 패턴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한국 남자들의 저물녘은 노년기에 접어들면 더더욱 쓸쓸해진다. 취재팀은 지난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온다는 이모(67) 씨는 “공원에 나오는 건 굳이 따지자면 가야할 곳을 만들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할 일은 없지만 그냥 마음이 편해, 다들 같은 처지니까….”
이 씨는 30년 동안 일해 서울 강북에 25평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고, 네 딸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고 한다.
“딸들이 보란 듯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결혼식장에서도 뿌듯하기는 마찬가지였지.”
그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가 이내 한숨을 쉬었다. 출가한 네 딸은 이젠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어렵다. 이제 남은 것은 늙은 몸과 딸들이 가끔 주는 용돈, 명절 때 가끔 보는 손자 손녀들이다. 남들은 ‘딸 집을 돌아다니며 손자들 보면서 놀다 오라’고 말하지만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다. “눈치가 보여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노인들이 요즘 떠돈다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상처(喪妻)한 뒤 서울의 아들 집에 살게 된 노인이 우연히 아들 부부가 자기들끼리 식구들의 순번을 붙여 “1번 학원 갔니?” 식으로 부르는 걸 엿들었다는 것.
우선순위 1번은 아이(손자)였고, 2번은 며느리, 3번은 아들, 4번은 아이 봐주는 가정부였다. 그런데 노인은 5번도 아니었다. 5번은 애완견이었던 것. 며칠 후 노인은 “3번아 찾지 마라, 6번은 간다”는 쪽지를 남겨 놓고 시골집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설마 실제 이야기겠어. 웃자고 만든 거겠지.”
한 2년 전부터 이곳에 나온다는 강모(66) 씨는 “은퇴하니까 집에만 있던 아내가 오히려 더 신세가 좋아 보이더라”고 말했다.
“10년이 넘게 한동네서 살았으니 아내는 이웃들을 잘 알지. 친구도 유지되고. 자기들끼리 놀러도 가고. 그런데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매일 아침 회사 가서 밤늦게 들어왔는데….”
퇴직 전 중소기업에 다녔다는 한모(69) 씨는 “아내가 친구들하고 놀러가는 걸 막으면 ‘좀팽이’ 남편이 되지만 남자들이야 어디 그럴 수 있나. 당장 난리가 난다. 30년 동안 친구들하고 여행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푸념했다.
전남대 심리학과 윤가현(尹嘉鉉·한국노년학회 부회장) 교수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채 노년을 맞은 노인들에겐 각종 노인 관련 강좌, 노인대학, 건강교실, 레크리에이션 등에 참가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며 “보통 ‘에이 그런데 가서 어떻게 즐기고 사람을 만나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자각을 주는 강의를 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경제적 상태는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심리적인 상태가 변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