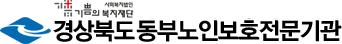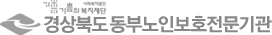“82세 아들 부부 효심에 세상근심 몰라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1,545회 댓글 0건본문
5월,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따뜻한 웃음과 행복한 순간이 피어나는 순수의 키워드다. 사랑과 온정이 사라진 이 땅,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피난처다.
어둡고 거친 곳에서 야윈 가슴으로 살면서도 사랑을 지키는 가족을 만났다. 정용수 할아버지 가족이다. 정할아버지는 107세. 주민등록번호 991016-9397×××.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다. 아들 정병훈씨(82), 며느리 이옥희씨(74), 그리고 태어난 지 77일된 증손자와 살고 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나이를 합하면 264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빌라 지하층에 사는 정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40여분을 헤맸다. 한두 동씩 지은 고만고만한 빌라들이 미로를 만들며 수백채 모여있는 곳에서 정할아버지 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지도도 무용지물. 가까스로 아들 정병훈 할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파트를 찾았다. 자택에서 걸어서 3분거리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세 많은 할아버지를 찾아왔냐”며 “아들부부의 효심이 지극해 107세에도 정정하다”고 입을 모았다.
#107세 아버지-모두 이루었어요
‘아들할아버지’를 따라간 지하 빌라에선 막 잠에서 깬 아기가 울고 있었다. 정병훈 할아버지의 막내아들이 낳은 기훈이다. 할머니가 우유병을 물리자 20평 빌라가 조용해진다.
정용수 증조할아버지는 고운 한복차림으로 꼿꼿이 앉아 있었다. 항상 한복을 입는다고 했다. 큰소리로 인사하니 껄껄 웃는다. “나, 귀 안먹었어. 말도 잘해. 일본놈들에게 고문도 많이 당했지. 6·25전쟁 끔찍했고. 그 세월 다 살아냈으니…. 안사람과 아이들 죽고 돈번 것 없어 슬펐지만, 그것도 젊어 한때지. 이젠 더 이상 해 달랄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할아버지는 60대까지 고향인 강원도 양구에서 농사를 지었다. 부인 김봉혜씨는 해방전 아이를 낳다 28세때 세상을 떠났다. 2남3녀 중 두 아들만 살아남았고 큰아들 정병훈 할아버지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
“20대 중반까지 놀러만 다니고 농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제련소에서 일했지. 오른손 엄지손가락 마디 하나가 그때 잘려나갔어. 술취한 채 공장에 들어갔는데, 손가락이 잘려 다행이지, 하마터면 몸이 빨려 들어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거야. 재미없지? 6·25 때 충북 제천으로 피란가서 40여년동안 농사를 지었어.” ‘며느리할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내내 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옷장엔 세 벌의 겨울용 한복이 걸려있다. 용변실수 때문에 여벌옷이 많은가 했다. “아니에요. 잘 걷고 식사도 가리지 않으세요. 용변도 혼자보시구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정하셔야 할텐데….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존심 강하신 분이….”
시아버지의 한복동정을 달고 있는 할머니 옆에서 할아버지가 거든다. “1년반전 이곳에 1천7백만원 전세로 왔어요. 지하층이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데, 아버님께선 이 집을 못마땅해하세요. 지하빌라에 햇빛이 들지 않아, 아침이 됐는지 저녁이 됐는지 모르겠다구요.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갈텐데 벌써부터 묘지 같은 곳에서 사시기 싫대요.”
#82세 아들-손자들이 날 더 좋아해요
정용수옹은 지난해 가을까진 혼자 동네를 산책하며 건강을 돌봤지만 요즘은 주로 집에만 있기 때문에 햇볕 드는 1층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정병훈 할아버지는 모아둔 돈이 없다. 두섭(53)·은섭(49)·희섭(43)씨, 삼형제를 낳았지만 제 살기도 힘들다. 핏덩이 손자 기훈이를 키우는 이유가 딱하다. 아들이 직장 나가고 며느리는 15살된 뇌성마비 큰아들을 돌보느라 막내 기훈이를 키울 여유가 없다.
8년전 인천에 정착한 후 아들할아버지 부부는 폐품을 팔아 생활했다. 신문과 종이상자는 ㎏당 60원. 부지런히 모아야 하루에 5,000원. 한달 15만원으로 근근이 살았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받고 싶어도 세 아들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없이 살아도 정용수옹이 매일 20개씩 먹는 야쿠르트는 거른 적이 없다. 다행히 지난해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월급 50만원을 받는다. 할아버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고 한달에 두번 쉰다. 고물도 계속 모아 팔고 있다. 방마다 걸어둔 밥상크기의 대형벽시계가 생뚱맞다 싶더니 길에서 주워온 것이란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 몇 개도 그랬다.
“처음 고물을 주울 땐 너무 창피해서 밤에만 다녔어요. 요즘은 아파트와 동회 등 주위에서 고물을 가져가라고 전화도 해주고, 반찬과 쌀도 주세요. 그저 고맙죠.”
어려운 살림에도 효성이 극진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효부상과 효자상을 각각 세번씩 받았다. 할아버지는 3년전 모범구민상도 탔다. 지난달 25일에는 남동구청에서 효자상 대상을 받았다. 부상인 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는 재산목록 1호가 됐다.
#75세 며느리-아버님은 제 은인이세요
할머니는 나이를 묻자 잘 모르겠다며 입을 가리고 수줍게 웃었다. 자녀들 나이도 모르겠다고 했다. 사느라 지쳐 모든 걸 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습관이 돼버린 듯했다. 거친 손등, 골 팬 주름살, 낡은 몸에 새겨진 인고의 세월에도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이다.
아끼며 사느라 화장을 해본 적이 없다. 머리도 집에서 자른다. 결혼식도 6·25때 올리느라 화장은커녕 물 떠놓고 절한 게 전부. 선물도 몇 해 전 강원도에서 남편이 사준 손목시계가 유일하다. 할머니는 삶이 고생스러운데 무슨 선물타령이냐고 했다.
할머니는 18세에 결혼했다. 강원도 인제 출신 할머니는 17세에 홀어머니와 헤어져 식모살이를 했다. 너무 고달파 친척아저씨집에 얹혀 살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돈이 없어 시신을 개울바닥에 묻었다. 장마가 지자 시신이 떠내려갈까봐 매일 울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없을 때 친척아저씨가 중매를 섰다. 결혼하면 시댁에서 어머니 산소를 원주 근처 양지바른 산에 마련해주겠다는 조건.
“친정어머니를 모셔주었으니 은혜를 갚아야죠. 가난했지만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모시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제 은인이잖아요.”
부부는 갖고 싶은 게 없다고 했다. 돈도 필요없다고 했다. “그전엔 옷도 사입고 그릇도 사고 싶고 돈도 많이 모으고 싶었는데…. 이젠 그저 먹고 사는 것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둘째 아들이 마음에 걸리긴 하죠.”
힘든 살림에 심신이 지쳤지만, 할머니는 관절염을 앓으며 홀로 사는 둘째 아들 걱정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내가 부지런히 고물을 모아야 전세방이라도 마련해줄텐데…. 가족이 별 건가요. 이렇게 모여살며 서로 걱정해주면 가족이죠.” 할머니의 눈물. 사랑이었다. 손자의 숨소리와 할아버지의 기침소리가 함께한 지하방, 그곳에서 가족의 사랑을 보았다. 그건 서로를 보듬는 가족의 울림이었다.
5월이다. 부드러운 바람이 분다.
〈인터뷰/유인화 매거진X부장 rhew@kyunghyang.com〉
입력: 2005년 05월 01일 17:50:07 / 최종 편집: 2005년 05월 01일 18:37:17
어둡고 거친 곳에서 야윈 가슴으로 살면서도 사랑을 지키는 가족을 만났다. 정용수 할아버지 가족이다. 정할아버지는 107세. 주민등록번호 991016-9397×××.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아버지다. 아들 정병훈씨(82), 며느리 이옥희씨(74), 그리고 태어난 지 77일된 증손자와 살고 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과 며느리의 나이를 합하면 264살.
인천 남동구 구월동 빌라 지하층에 사는 정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40여분을 헤맸다. 한두 동씩 지은 고만고만한 빌라들이 미로를 만들며 수백채 모여있는 곳에서 정할아버지 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지도도 무용지물. 가까스로 아들 정병훈 할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파트를 찾았다. 자택에서 걸어서 3분거리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세 많은 할아버지를 찾아왔냐”며 “아들부부의 효심이 지극해 107세에도 정정하다”고 입을 모았다.
#107세 아버지-모두 이루었어요
‘아들할아버지’를 따라간 지하 빌라에선 막 잠에서 깬 아기가 울고 있었다. 정병훈 할아버지의 막내아들이 낳은 기훈이다. 할머니가 우유병을 물리자 20평 빌라가 조용해진다.
정용수 증조할아버지는 고운 한복차림으로 꼿꼿이 앉아 있었다. 항상 한복을 입는다고 했다. 큰소리로 인사하니 껄껄 웃는다. “나, 귀 안먹었어. 말도 잘해. 일본놈들에게 고문도 많이 당했지. 6·25전쟁 끔찍했고. 그 세월 다 살아냈으니…. 안사람과 아이들 죽고 돈번 것 없어 슬펐지만, 그것도 젊어 한때지. 이젠 더 이상 해 달랄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할아버지는 60대까지 고향인 강원도 양구에서 농사를 지었다. 부인 김봉혜씨는 해방전 아이를 낳다 28세때 세상을 떠났다. 2남3녀 중 두 아들만 살아남았고 큰아들 정병훈 할아버지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
“20대 중반까지 놀러만 다니고 농사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제련소에서 일했지. 오른손 엄지손가락 마디 하나가 그때 잘려나갔어. 술취한 채 공장에 들어갔는데, 손가락이 잘려 다행이지, 하마터면 몸이 빨려 들어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거야. 재미없지? 6·25 때 충북 제천으로 피란가서 40여년동안 농사를 지었어.” ‘며느리할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내내 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옷장엔 세 벌의 겨울용 한복이 걸려있다. 용변실수 때문에 여벌옷이 많은가 했다. “아니에요. 잘 걷고 식사도 가리지 않으세요. 용변도 혼자보시구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정하셔야 할텐데…. 제가 대소변을 받아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존심 강하신 분이….”
시아버지의 한복동정을 달고 있는 할머니 옆에서 할아버지가 거든다. “1년반전 이곳에 1천7백만원 전세로 왔어요. 지하층이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데, 아버님께선 이 집을 못마땅해하세요. 지하빌라에 햇빛이 들지 않아, 아침이 됐는지 저녁이 됐는지 모르겠다구요. 죽으면 땅속으로 들어갈텐데 벌써부터 묘지 같은 곳에서 사시기 싫대요.”
#82세 아들-손자들이 날 더 좋아해요
정용수옹은 지난해 가을까진 혼자 동네를 산책하며 건강을 돌봤지만 요즘은 주로 집에만 있기 때문에 햇볕 드는 1층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정병훈 할아버지는 모아둔 돈이 없다. 두섭(53)·은섭(49)·희섭(43)씨, 삼형제를 낳았지만 제 살기도 힘들다. 핏덩이 손자 기훈이를 키우는 이유가 딱하다. 아들이 직장 나가고 며느리는 15살된 뇌성마비 큰아들을 돌보느라 막내 기훈이를 키울 여유가 없다.
8년전 인천에 정착한 후 아들할아버지 부부는 폐품을 팔아 생활했다. 신문과 종이상자는 ㎏당 60원. 부지런히 모아야 하루에 5,000원. 한달 15만원으로 근근이 살았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받고 싶어도 세 아들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없이 살아도 정용수옹이 매일 20개씩 먹는 야쿠르트는 거른 적이 없다. 다행히 지난해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월급 50만원을 받는다. 할아버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하고 한달에 두번 쉰다. 고물도 계속 모아 팔고 있다. 방마다 걸어둔 밥상크기의 대형벽시계가 생뚱맞다 싶더니 길에서 주워온 것이란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 몇 개도 그랬다.
“처음 고물을 주울 땐 너무 창피해서 밤에만 다녔어요. 요즘은 아파트와 동회 등 주위에서 고물을 가져가라고 전화도 해주고, 반찬과 쌀도 주세요. 그저 고맙죠.”
어려운 살림에도 효성이 극진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효부상과 효자상을 각각 세번씩 받았다. 할아버지는 3년전 모범구민상도 탔다. 지난달 25일에는 남동구청에서 효자상 대상을 받았다. 부상인 7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는 재산목록 1호가 됐다.
#75세 며느리-아버님은 제 은인이세요
할머니는 나이를 묻자 잘 모르겠다며 입을 가리고 수줍게 웃었다. 자녀들 나이도 모르겠다고 했다. 사느라 지쳐 모든 걸 잊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습관이 돼버린 듯했다. 거친 손등, 골 팬 주름살, 낡은 몸에 새겨진 인고의 세월에도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이다.
아끼며 사느라 화장을 해본 적이 없다. 머리도 집에서 자른다. 결혼식도 6·25때 올리느라 화장은커녕 물 떠놓고 절한 게 전부. 선물도 몇 해 전 강원도에서 남편이 사준 손목시계가 유일하다. 할머니는 삶이 고생스러운데 무슨 선물타령이냐고 했다.
할머니는 18세에 결혼했다. 강원도 인제 출신 할머니는 17세에 홀어머니와 헤어져 식모살이를 했다. 너무 고달파 친척아저씨집에 얹혀 살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돈이 없어 시신을 개울바닥에 묻었다. 장마가 지자 시신이 떠내려갈까봐 매일 울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없을 때 친척아저씨가 중매를 섰다. 결혼하면 시댁에서 어머니 산소를 원주 근처 양지바른 산에 마련해주겠다는 조건.
“친정어머니를 모셔주었으니 은혜를 갚아야죠. 가난했지만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 모시고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제 은인이잖아요.”
부부는 갖고 싶은 게 없다고 했다. 돈도 필요없다고 했다. “그전엔 옷도 사입고 그릇도 사고 싶고 돈도 많이 모으고 싶었는데…. 이젠 그저 먹고 사는 것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지 둘째 아들이 마음에 걸리긴 하죠.”
힘든 살림에 심신이 지쳤지만, 할머니는 관절염을 앓으며 홀로 사는 둘째 아들 걱정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내가 부지런히 고물을 모아야 전세방이라도 마련해줄텐데…. 가족이 별 건가요. 이렇게 모여살며 서로 걱정해주면 가족이죠.” 할머니의 눈물. 사랑이었다. 손자의 숨소리와 할아버지의 기침소리가 함께한 지하방, 그곳에서 가족의 사랑을 보았다. 그건 서로를 보듬는 가족의 울림이었다.
5월이다. 부드러운 바람이 분다.
〈인터뷰/유인화 매거진X부장 rhew@kyunghyang.com〉
입력: 2005년 05월 01일 17:50:07 / 최종 편집: 2005년 05월 01일 18:37: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