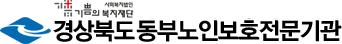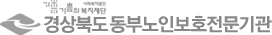"어머니를포기함"절연각서쓰는 자식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693회 댓글 0건본문
병원, 복지시설, 빈집… 버려지는 부모들 현대판 고려장 급증
[조선일보 김정훈, 이용수 기자]
“이○○씨가 어머니인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인 이모(82)씨는 작년 말 인천 남동구 S복지시설에 들어오면서 두 딸이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시설에 맡긴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식인 자신들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식 포기 각서’인 셈이다.
몇 차례 이씨가 “딸네 집으로 가겠다”고 우겨 찾아갔지만 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나중엔 이사를 가버렸다. 그 후 어렵게 연락이 된 손녀들도 “그 할머니는 우리 엄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가족 해체와 이기주의, 평균 수명 연장 등 구조적인 문제가 극심한 경제 불황과 맞물리면서 자식이 병원이나 외딴 집에 부모를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 늘고 있다.
경기도 이천의 양지요양병원. 1년 이상 치료비가 밀려 있는 노인만 5명. 한 달 입원비 150만원을 3~4개월 연체한 경우도 올해 들어 15건으로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3개월 이상 치료비를 연체한 노인수가 경기 오산노인병원과 충남 부여노인병원에서 각각 10명(작년 6명)과 6명(작년 4명)에 이르고 있으며, 부여노인병원의 경우 보호자와의 연락이 2년 이상 끊긴 경우도 있다. 이들 병원 관계자는 “입원비를 연체시키는 자식들 상당수는 사실상 부모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입원비를 다시 내고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갈 곳 없는 노인 90여명이 수용된 인천 계양구 ‘즐거운집’(미신고시설). 이곳 정순옥(50) 사무장은 올 초 “정문에 노인이 앉아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손전등으로 살폈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온 정씨에게 “쓰레기통 옆에 있으니 잘 봐라”는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정씨는 “옷 보자기를 끌어안고 오도카니 앉아 있던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자 저만치서 승용차 한 대가 부리나케 달아났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시설 ‘작은손길공동체’의 김영매(여·50)씨는 “복지시설에 버려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한다. 작년 여름 철거 직전의 두 칸짜리 아파트에서 할머니를 발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찾아낸 할머니의 집에는 세간도 이불도 음식도 없었다. 사흘째 굶고 있었다는 할머니는 고향을 물으면 대답했지만, 자식에 대해 물으면 말문을 닫았다고 한다.
불황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이용한 뒤 버리는 비정한 사례도 발견된다. 인천시 서구 오류동 낙원양로원. 이곳에 머문 지 여덟 달째가 된 이모(60)씨는 충남에 있는 공장에서 크레인운전을 하면서 번 돈을 몽땅 집에 부치고 기숙사 생활을 했다. 떨어져 살던 아들(28)은 이씨 명의의 아파트와 인감도장을 빼돌려 대출을 받았다. 그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이씨에게 뇌졸중이 덮쳤지만 아들은 병원 입원비만 계산하고 주소를 옮겨 버렸다고 한다.
이씨는 65세 미만인 데다 호적에 부인과 아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자격도 없었다. 8개월 동안 동네 야산에서 살아야 했다. 사정사정해 양로원에 왔다는 이씨는 “그놈들 원수를 갚기 전엔 죽을 수도 없다”며 병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울먹였다.
낙원양로원 노인 53명 중 드물게라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노인은 3명뿐이다. 나머지 노인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도, 오라는 곳도 없다. 양명숙(여·41) 사무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족은 부부와 자식뿐”이라며 “애라도 볼 수 있고 전화라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버려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정훈, 이용수 기자]
“이○○씨가 어머니인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치매 환자인 이모(82)씨는 작년 말 인천 남동구 S복지시설에 들어오면서 두 딸이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시설에 맡긴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식인 자신들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식 포기 각서’인 셈이다.
몇 차례 이씨가 “딸네 집으로 가겠다”고 우겨 찾아갔지만 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나중엔 이사를 가버렸다. 그 후 어렵게 연락이 된 손녀들도 “그 할머니는 우리 엄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가족 해체와 이기주의, 평균 수명 연장 등 구조적인 문제가 극심한 경제 불황과 맞물리면서 자식이 병원이나 외딴 집에 부모를 버리는 ‘현대판 고려장’이 늘고 있다.
경기도 이천의 양지요양병원. 1년 이상 치료비가 밀려 있는 노인만 5명. 한 달 입원비 150만원을 3~4개월 연체한 경우도 올해 들어 15건으로 지난해의 2배 수준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3개월 이상 치료비를 연체한 노인수가 경기 오산노인병원과 충남 부여노인병원에서 각각 10명(작년 6명)과 6명(작년 4명)에 이르고 있으며, 부여노인병원의 경우 보호자와의 연락이 2년 이상 끊긴 경우도 있다. 이들 병원 관계자는 “입원비를 연체시키는 자식들 상당수는 사실상 부모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입원비를 다시 내고 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갈 곳 없는 노인 90여명이 수용된 인천 계양구 ‘즐거운집’(미신고시설). 이곳 정순옥(50) 사무장은 올 초 “정문에 노인이 앉아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손전등으로 살폈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온 정씨에게 “쓰레기통 옆에 있으니 잘 봐라”는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정씨는 “옷 보자기를 끌어안고 오도카니 앉아 있던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자 저만치서 승용차 한 대가 부리나케 달아났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시설 ‘작은손길공동체’의 김영매(여·50)씨는 “복지시설에 버려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한다. 작년 여름 철거 직전의 두 칸짜리 아파트에서 할머니를 발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연히 찾아낸 할머니의 집에는 세간도 이불도 음식도 없었다. 사흘째 굶고 있었다는 할머니는 고향을 물으면 대답했지만, 자식에 대해 물으면 말문을 닫았다고 한다.
불황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이용한 뒤 버리는 비정한 사례도 발견된다. 인천시 서구 오류동 낙원양로원. 이곳에 머문 지 여덟 달째가 된 이모(60)씨는 충남에 있는 공장에서 크레인운전을 하면서 번 돈을 몽땅 집에 부치고 기숙사 생활을 했다. 떨어져 살던 아들(28)은 이씨 명의의 아파트와 인감도장을 빼돌려 대출을 받았다. 그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이씨에게 뇌졸중이 덮쳤지만 아들은 병원 입원비만 계산하고 주소를 옮겨 버렸다고 한다.
이씨는 65세 미만인 데다 호적에 부인과 아들의 이름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자격도 없었다. 8개월 동안 동네 야산에서 살아야 했다. 사정사정해 양로원에 왔다는 이씨는 “그놈들 원수를 갚기 전엔 죽을 수도 없다”며 병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한 채 울먹였다.
낙원양로원 노인 53명 중 드물게라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노인은 3명뿐이다. 나머지 노인에게는 찾아오는 사람도, 오라는 곳도 없다. 양명숙(여·41) 사무장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족은 부부와 자식뿐”이라며 “애라도 볼 수 있고 전화라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버려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