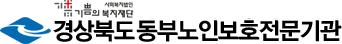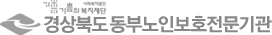기타 내 집에서 맞는 노년의 삶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7 10:08 조회 788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 11. 24. 04:09
지난 6월 독일 베를린 장기요양기관인 키르슈베르크 노인거주공원 거주시설을 취재하러 갔을 때였다. 같은 방을 쓰는 102호 벨쉬(87)씨와 그의 아내가 자신들의 공간을 선뜻 안내했다. 2인 1실을 사용하는 이들은 집에서 쓰던 물건을 가져와 공간을 채웠다. 벽면에는 손주들 사진과 자신들의 젊었을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들에게는 아마도 생애 마지막이 될 집이었다.
벨쉬씨 부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지냈다. 그러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집안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시설로 오게 됐다고 했다. 이곳에서는 집과 달리 요양보호사의 보살핌을 받고 공용 공간에서 단체활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하지만 작은 테라스가 딸린 부부만의 공간, 그리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집에서 마지막을 맞는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듯했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병들고 쇠약해진다. 당장 특정 질환이 악화해 급성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시·청력이 감소하거나 낙상, 섬망처럼 ‘노인병 증후군’ 정도만을 겪기도 한다.
한국에서 노년을 맞게 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시간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타임슬립’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고 상상해봤다. 정신은 멀쩡한데 거동이 불편해 낯선 이들과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모습이 떠올랐다. 영화 ‘은교’의 대사를 빌리자면 ‘젊음은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늙음도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라지만, 낯선 시설 속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건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은 삶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될 건강 수준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라면 스스로 “시설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더욱 하기 싫을 것이다. 누구나 내 집에서, 내가 머물던 익숙한 공간에서, 주변 친구·이웃이 사는 곳에서 나이를 먹는 것(Aging in place)을 원할 것이다. 벨쉬씨 부부가 1년 전인 여든여섯 살까지 집에서 머물던 이유도 그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노년이 되면 찾아올 만성 질환들을 관리하려면 한 달에 적어도 1~2회는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아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지기라도 하면 자녀의 부담과 걱정도 커질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런 제약들 때문에 노인 혹은 보호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벨쉬씨가 머무는 공간처럼 가정 친화적인 유닛(unit) 형태의 시설이 늘어나면 행복한 노년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가복지, 특히 장기요양 재택 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장기요양 재택 의료 시범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이뤄 매달 어르신 댁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노년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다. ‘존엄한 노후’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단, 이상적인 시스템을 채울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게 과제다. 요즘 복지부에는 연금 개혁,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리기, 간호 인력 지원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정치권이 나섰고 국민의 관심도 큰 사안들이다. 상대적으로 노인 관련 정책에 관한 관심은 적다. 노인 문제가 주목받는 건 요양시설의 자극적인 학대 사례가 보도될 때뿐이다. 마침 생일을 맞아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본다. 늙음이 벌이 아니라 찬란했던 청춘의 마지막 페이지로 마무리되길 희망한다. 또 노년의 문제를 앞서 고민하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보건복지 담당 기자로서 응원을 보낸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