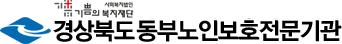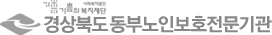기타 시골 마을 버려진 축사에 뿌린 복음 씨앗… 은혜 열매 맺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9 10:01 조회 615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07-18 03:03

정훈영(오른쪽) 단비교회 목사가 수년 전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뒤 교회 앞마당에서 활짝 웃으며
교제를 나누고 있다. 단비교회 제공
경부고속도로를 빠져 나와 한적한 천안 외곽 국도로 한참을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크고 작은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이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한다. 그마저도 동네 정미소를 통과하자 건물은 사라지고 기다랗게 이어지는 벚나무길과 두루미가 노니는 개울만 시선에 들어온다. 이 길이 비포장도로였던 31년 전, 스물여섯의 나이로 마을을 찾아온 청년이 있었다.
“봄바람 불던 날. 1992년 부활절을 앞두고 아는 목사님 소개로 교회 없는 동네를 찾아온 건데, 천안이 고향인 저도 잘 모르는 외딴 마을이더군요. 여러 해 전에 버려진 축사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돼 정착하기로 한 게 벌써 이렇게 됐네요(웃음).”
지난 3일 만난 정훈영(57) 단비교회 목사의 목회 여정은 그의 사람 냄새나는 푸근한 미소만큼 목가적이다. 1980년대 줄곧 이어진 이촌향도(離村向都)가 멈출 줄 모르던 90년대 초반. 시대를 역행하듯 시골 마을에 둥지를 튼 젊은 전도사는 사람들에게 경계 대상 1호였다. 시대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척박한 땅이었을 터였다. 하지만 정 목사는 “하나님께선 다른 곳에선 싹터서 자랄 수 없는 씨앗 하나를 이곳 토양에 심기게 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단비교회와 함께 보낸 지난 시간은 ‘못난 씨앗’이 입은 은혜에 관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축사 곳곳을 손보고 우여곡절 끝에 드리게 된 첫 예배. 단비교회의 시작을 같이 한 사람은 고작 세 명이었다. 정 목사와 그의 동갑내기 동창생, 그리고 서울에서 온 동창생의 친구였다. 미술을 전공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동창생의 친구는 첫 예배 후 몇 차례 마을을 다시 찾아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같이 예배도 드리며 인연을 이어갔다. 그렇게 1년여 시간이 흘렀을까. 최연소 주민이 50대였던 마을에 20대 청년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 정 목사와 이애경 사모다.
예나 지금이나 농촌엔 사람이 없다. 특히 청년이 없다. 두 사람은 목사와 사모이기보다 농부이자 촌부로 살아갔다. 일상은 농사일 거들기, 집수리 돕기, 어르신 이야기 들어드리기로 채워졌다. 선교라는 명분으로 조건 달듯 어르신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 일은 없었다. 그저 교회는 그분들의 생활 울타리에 있었다.
“어르신들처럼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다는 동질감은 시샘을 허용하지 않지요.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어르신들이 저희 부부에게 논과 밭을 내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정 목사는 당시 마을에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유기농으로 농사짓기를 시작했다.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해 큰 수확의 기쁨을 맛봤고 이후 마을엔 유기농 농사가 조금씩 확산됐다.
그렇게 부부의 용암2리 ‘전원일기’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위기가 찾아왔다. 축사 교회가 들어서 있던 땅 주인에게 사정이 생겨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교회당을 허물어야 할 상황에 빠진 것이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없었고,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을 형편도 안 되는 이들에게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이 흘러왔다.
“마을 어르신들이 주머니를 털어 토지 구입에 필요한 돈을 모아 주셨어요. 한 번은 최고령 할아버님이 마루에 앉으시더니 10만원을 건네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생전에 이렇게 기분 좋긴 첨이유. 교회가 그 땅을 사서 이제 이 동네서 아주 살게 됐으니 말유. 이 돈 목사한티 줘유. 땅 사는 데 보태진 못해두 오매가매 기름값이라두 하라구유.’”(이 사모)
2002년 기초공사를 시작한 지 꼬박 10년째 되던 2011년 10월, 단비교회는 입당예배를 드렸다. 정 목사는 마을의 대목수 어르신을 스승으로 모시며 한 수씩 배웠다. 나무 고르는 법, 나무 다루고 다듬는 법, 대들보와 흙벽을 세우고 기와 올리는 법 등을 손수 배워 우직하게 교회를 지었다.
나지막한 은밤산 아랫자락을 배경으로 세워진 ‘ㄱ자형’ 2층 한옥은 노랗고 붉고 푸른빛이 다채롭게 기와 옷을 입고 있다. 이 사모가 전공을 살려 기와에 하나하나 색을 입힌 결과물이다. 건축 자재가 아무리 좋아도 일꾼 없이 건물이 지어지진 않는다. 정 목사는 “도시교회 청년부 성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줬다”며 “그 중엔 20년 넘게 한 달에 두 번씩 찾아와 건축과 농사일을 도와준 곳도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건축 기간 비닐하우스에 임시 예배당을 세우고, 삼남매와 함께 컨테이너에서 살았던 광야 시절을 거쳐 예배당이 마련되면서 이 사모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공간도 있다. 작지만 소중한 그림 작업실이다. 새벽녘 주어지는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폭에 담아낸 건 할머님들의 얼굴과 마을 풍경이다.

그의 작품엔 시골살이가 설고 외로워 아기를 업고 동네 한 바퀴 돌다 마주치면 삼켰던 눈물도 영락없이 알아보시던 ‘도돗물 할머니’, 주걱만하던 호미 한 자루가 닳아 숟가락만큼 작아질 때까지 밭에서만 사셨던 ‘여울이 할머니’ 등 흙에서 사람을 만나 흙에서 삶을 배운 어르신들의 삶이 오롯이 물들어 있다.
이 사모는 “내겐 가족 같다는 느낌을 넘어 어머니 이상이었고 어르신들에게도 자식 이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열린 생애 첫 개인전 제목을 ‘꽃을 피우며 따라가겠습니다’로 정한 이유도 하루하루가 기도였고 순례였던 그분들의 삶이 깃든 이곳에서 그분들에게 배운 가르침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실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회와 사택 옆에 나란히 건축된 도란도란 노인복지센터는 부부가 어르신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아가는 일상 공간이다. 어르신들이 마을을 떠나 멀리 떨어진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고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8년 전부터 이곳으로 모신 것이다. 날씨가 좋을 땐 어르신들과 밭에 나와 농작물을 기른다는 정 목사에게서 마을의 희망지기 내음이 진하게 풍겼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